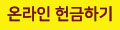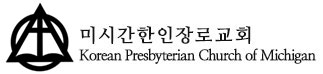목민심서(牧民心書)/이전육조(吏典六條)
1. 속리(束吏) : 아전 단속을 너그러우면서도 엄하게 하라
束吏之本(속리지본) :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
在於律己(재어율기) : 자기 처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데 있다.
其身正(기신정) : 자신이 바르면
不令而行(불령이행) :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어질 것이고
其身不正(기신불정) : 올바르지 못하면
雖令不行(수영불행) : 명령을 하여도 잘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.
齊之以禮(제지이예) : 예법(禮)로써 정제하고
接之有恩(접지유은) : 은혜로써 대접한
然後束之以法(연후속지이법) : 뒤에 법으로써 단속하여야 한다.
若陵轢虐使顚倒詭遇者(약릉력학사전도궤우자) : 만약 업신여기고 학대 혹사하고 짓밟으면 심하게 다룬다면
不受束也(불수속야) : 단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.
居上不寬(거상불관) :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한 것을
聖人攸誡(성인유계) : 성인은 경계하였다.
寬而不弛(관이불이) : 너그러우면서도 해이하지 않으며
仁而不懦(인이불나) :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다면
亦無所廢事矣(역무소폐사의) : 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.
誘之掖之(유지액지) : 이끌어 주고 도와 주며
敎之誨之(교지회지) : 가르치고 깨우쳐주면
彼亦人性(피역인성) : 그들도 인성(人性)이 있으니
未有不格(미유불격) : 고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.
威不可先施矣(위불가선시의) : 위엄을 먼저 베풀어서는 안 된다.
誘之不牖(유지불유) : 타일러 주어도 깨우치지 못하고
敎之不悛(교지불전) : 가르쳐도 고치지 않고
怙終欺詐(호종기사) : 사기를 일삼아서 매우 악하거나
爲元惡大奸者(위원악대간자) : 간사한 자는
刑以臨之(형이임지) : 형벌로써 다스려야 한다.
元惡大奸須於布政司外(원악대간수어포정사외) : 매우 악하고 간사한 자는 감영(監營) 밖에다
立碑鐫名(입비전명) : 비를 세우고 이름을 새겨서
永勿復屬(영물복속) : 영원히 다시 복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.
牧之所好(목지소호) : 수령의 기호에
吏無不迎合(이무불영합) : 비위에 맞추지 않는 아전은 없다.
知我好財(지아호재) : 내가 재물을 좋아하는 것을 알면
必誘之以利(필유지이이) : 반드시 이(利)로써 유혹할 것이다.
一爲所誘(일위소유) : 한 번 유혹 당한다면
則興之同陷矣(즉흥지동함의) : 함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.
性有偏辟(성유편벽) : 수령의 성품이 한쪽으로 치우치면
吏則窺之(이즉규지) : 아전들은 그 틈을 엿보아
因以激之(인이격지) : 격동하여
以濟其奸(이제기간) : 그 간악한 죄를 성취시키게 되니
於是乎墮陷矣(어시호타함의) : 그의 술책에 떨어지게 되어
不知以爲知(불지이위지) : 그것을 깨달을 줄 모른다
酬應如流者(수응여류자) : 응하여 같이 따르면
牧之所以墮於吏也(목지소이타어이야) : 수령이 스스로 아전들의 농간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다.
吏之求乞(이지구걸) : 아전들이 구걸하면
民則病之(민칙병지) : 백성들은 고통스로워하고 괴로워한다.
禁之束之(금지속지) : 금지하고 단속하여
無碑縱惡(무비종악) : 함부로 나쁜 일 못하도록 해야 한다.
員額少(원액소) : 관원(官員)이 적으면
則閒居者寡(즉한거자과) : 한가하게 지내는 자가 적고
而虐斂未甚矣(이학렴미심의) :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.
今之鄕吏(금지향리) : 요즈음의 향리(鄕吏)들은
締交宰相(체교재상) : 재상과 결탁하고
關通察使(관통찰사) : 감사와 연통하여
上藐官長(상막관장) : 위로는 관장(官長)을 업신여기고
下剝生民(하박생민) : 아래로는 백성들을 착취한다.
能不爲是所屈者(능불위시소굴자) : 여기에 이들에게 굴하지지 않는다면
賢牧也(현목야) : 어진 수령이다.
首吏權重(수이권중) : 수리(首吏)는 권한이 무거우니
不可偏任(불가편임) : 치우치게 맡겨도 안 되며
不可數召(불가삭소) : 자주 불러도 안 된다.
有罪必罰(유죄필벌) :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여
使民無惑(사민무혹) : 백성들로 부터 의혹을 사지 없도록 하라.
吏屬參謁(이속참알) : 이속(吏屬)이 참알에 때는
宜禁白布衣帶(의금백포의대) : 흰 옷에 베로 만든 띠의 착용을 금하여야 한다.
吏屬遊宴(이속유연) : 아전들이 놀이와 잔치를 즐기는 것은
民所傷也(민소상야) :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바이다.
嚴禁屢戒(엄금누계) : 엄하게 금지하고 자주 경계하여
毋敢戱豫(무감희예) : 함부로 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.
吏屬用笞罰者(이속용태벌자) : 이청(吏廳)에서 태장(苔杖)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은
亦宜嚴禁(역의엄금) : 마땅히 엄금하여야 한다.
上官旣數月(상관기수월) : 부임한 지 수개월 지나면
作下吏履歷(작하이이력) : 부하 아전들의 이력표(履歷表)를 만들어서
表置之案上(표치지안상) : 책상 위에 놓아두도록 해야 한다.
吏之作奸(이지작간) : 아전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
史爲謨主(사위모주) : 사(史)가 주모자가 된다.
欲防吏奸(욕방이간) : 아전의 농간을 막으려면
怵其史(출기사) : 그 사를 두렵게 해야 하고
欲發吏奸(욕발이간) : 아전 농간을 부리려고 하면
鉤其史(구기사) : 사를 혼내 주어야 한다.
史者書客也(사자서객야) : 사(史)는 곧 서객(書客)이다.
<註>
속리(束吏) : 아전을 단속하는 것.
율기(律己) : 몸을 다스리는 것.
불령이행(不令而行) :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여지는 것.
제지이례(齊之以禮) : 예로써 정제하는 것.
속지이법(束之以法) : 법으로써 단속하는 것.
능력학사(陵轢虐使) : 업신여기고 짓밟으며 학대하고 혹사하는 것. 전도궤우(顚倒詭遇) : 거꾸로 세워 놓고 함부로 다루는 것.
불수속야(不受束也) : 단속을 받지 않는 것.
유계(攸誡) : 경계하는 바임.
관이불이(寬而不弛) : 너그러우면서도 해이하지 않는 것.
인이불나(仁而不懦) :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은 것.
폐사(廢事) : 일을 그르치는 것.
회지(誨之) : 가르쳐 주는 것. 또는 깨우쳐 주는 것.
피역인성(彼亦人性) : 그 또한 인성(人性)이 있다.
미유불격(未有不格) : 바로 잡아지지 않는 것이 없다.
기사(欺詐) : 속이는 것.
원악(元惡) : 악의 괴수.
형이임지(刑以臨之) : 형벌로써 임하는 것.
입비(立碑) : 비석을 세우는 것.
전명(鐫名) : 이름을 새기는 것.
영합(迎合) :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것.
유지이리(誘之以利) : 이익으로써 유혹하는 것.
일위소유(一爲所誘) : 한 번 유혹되면.
여지동함(與之同陷) : 그와 함께 죄에 빠지는 것.
규(窺) : 엿보는 것.
이제기간(以濟其奸) : 그 간악한 꾀를 성취시키는 것.
타함(墮陷) : 빠져 들어가는 것.
부지이위지(不知以爲知) :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는 것.
수응(酬應) : 묻는데 대답하는 것.
여류(如流) : 물 흐르는 것처럼 하는 것.
민즉병지(民즉病之) : 백성들은 괴롭게 생각한다.
금지속지(禁之束之) : 금하고 단속하여.
종악(縱惡) : 함부로 행악하는 것.
원액(員額) : 정원(定員).
한거자과(閒居者寡) : 한가하게 있는 자가 적다.
학렴(虐斂) : 무리하게 거두어들이는 것.
향리(鄕吏) : 시골 아전. 체교(체교) : 사귐을 갖는 것. 관
통찰사(關通察使) : 감사와 연통하는 것.
상모관장(上貌官長) : 위로 관장을 업신여기는 것.
하박생민(下剝生民) : 아래로 백성들의 껍질을 벗기는 것.
삭소(數召) : 자주 부르는 것.
사민무혹(使民無惑) : 백성들로 하여금 의혹이 없도록 부르는 것.
백포의대(白布衣帶) : 흰 천으로 만든 옷과 띠.
유연(遊宴) : 놀이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.
민소상야(民所傷也) : 백성이 미워하는 바이다.
누계(屢戒) : 자주 경계하는 것.
희예(희예) : 놀이하는 것.
모주(謀主) : 주모자(主謀者).
욕방이간(欲訪吏奸) : 아전의 농간을 방지하려 한다면.
사(史) : 서객(書客).
상관(上官) : 도임하는 것.
치지안상(置之案上) : 책상 위에 놓아두는 것.